
독일의 공공주택, ‘소찌알보눙(Sozialwohnung)’은 그 역사가 약 80년에 이른다. 1945년 끝난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독일 정부는 소찌알보눙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어 사회(Social)와 주택(Wohnung)의 합성어인 소찌알보눙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공무원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로, 통상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가리킨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를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공공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종류로 나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택, 위탁받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주택이다.
9일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뮌헨 등 독일에서만 8년째 거주 중인 30대 회사원 이준혁 씨는 “저소득층 공공주택은 WBS라는 주거자격증명서를 갖춘 사람이 입주할 수 있다”며 “집주인은 집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WBS는 연간 소득, 가족 구성원의 수와 조건 등을 기준으로 발급되는데 연간 소득은 1만6000유로(약 2570만원)~1만8000유로(약 2900만원)가 마지노선이다. 이 씨는 “독일의 올해 최저시급이 12.82유로(약 2만600원)”라며 “정말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WBS를 받고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대상 공공주택도 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A씨에 따르면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한 가격,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 도시 곳곳에 위치한 접근성 등 장점이 많다. 가족 구성에 따라 주택 규모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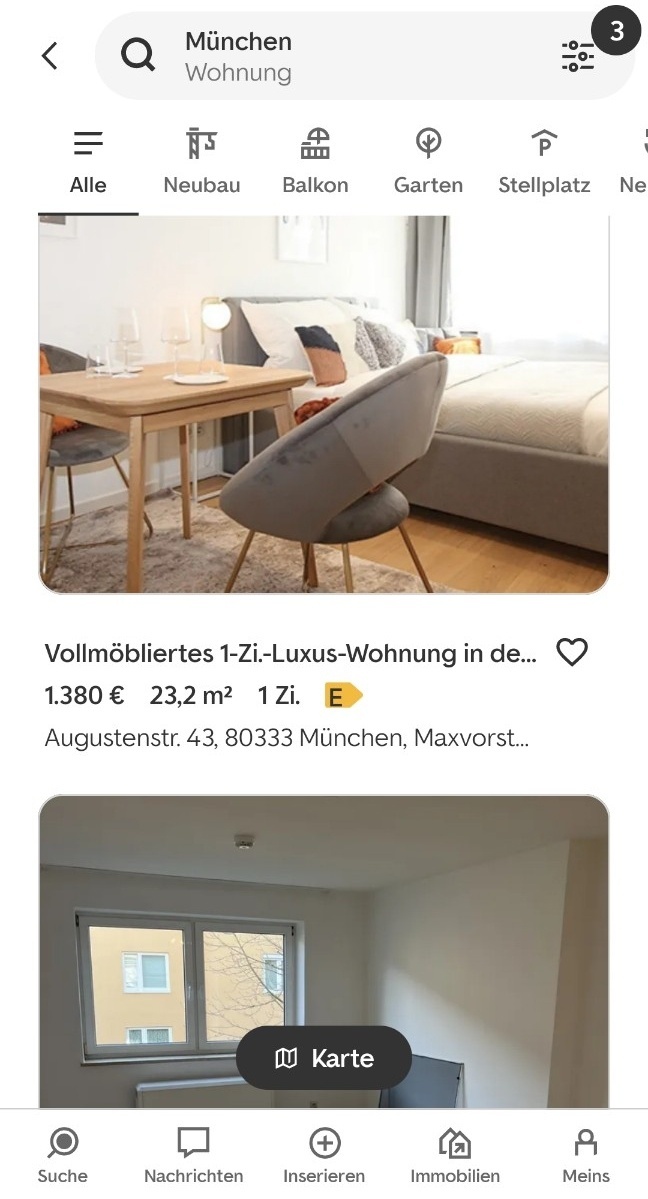
이 같은 소찌알보눙은 공공주택으로서 기간이 끝나면 일반주택으로 전환된다. 현재 100만 채 이하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새로 지어지는 공공주택의 수가 일반주택으로 전환되는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독일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및 민영화 정책이 배경이 되고 있다.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당초 독일 연방정부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역에 연간 40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하고 그 중 10만채는 145억유로(약 23조3000억원)를 들인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을 2022년 말 발표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건축 자재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공공주택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실정이다. 독일공영방송 AR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추가로 필요한 공공주택의 수는 91만채에 이른다.
이 씨는 “소찌알보눙의 수요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입주 조건만 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독일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내 집 마련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대도시의 주택은 어려워도 근교의 주택은 30대도 충분히 구매 가능하다”며 “대부분 기업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과 달리 독일은 주요 도시마다 기업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독일인들은 꼭 대도시에 집을 구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뿐만이 아니다. 인접국이자 공공주택의 천국이라 불리는 오스트리아는 수도 빈에서만 100여 년간 공공주택을 공급했으며 현재 약 22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대학생·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복합형 공공주택 ‘융에스 보넨’, 스마트형 공공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형 공공임대주택 단지 등이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빈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휴부지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공공주택을 누구나 원할 정도로 잘 짓기만 해도 민간 주택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 발전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통해 실감할 수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